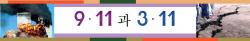한국사 교육, 빙하기에 들다
올해부터 한국사 한 줄 안 배워도 고교 졸업 가능
국민 91%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공식 만찬이 열린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 대통령은 “뷰티풀”을 외치며 최광식 박물관장에게 “한국문화가 이렇게 독특한지 몰랐다”고 했다. 한국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오바마 대통령이다. 이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새롭게 눈을 떴다고 볼 수 있다. 그냥 인사치레라고 넘길 일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역사 외교’의 힘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역사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만찬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어깨가 으쓱했다. 여러 정상이 한목소리로 “한국이 경제적으로만 잘사는 줄 알았는데, 문화까지 대단할 줄 몰랐다”고 했다.
세계가 놀라는 우리의 역사에 정작 우리는 무감각하다.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강조하는 보수정부에서 잇따라 역사교육이 축소되는 아이러니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사 교육의 양과 질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역사 교육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사회 각계 인사들이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유룡 KAIST 화학과 교수는 “외국 과학자들은 놀라울 만큼 역사 지식이 풍부하다. 인문계는 물론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에게도 한국사와 세계사를 모두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첼리스트 정명화씨는 “세계를 여행하는 연주자가 되면서 역사를 모르면 연주도 무너진다는 걸 깨달았다 ”고 말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5~6일 전국의 만 16세 이상 남녀 1130명을 대상으로 ‘역사 지식과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91.2%였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국사=필수과목’으로 응답한 것이다. 국사가 필수과목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5.9%, “모르고 있다”는 42.7%였다. 전화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으로 선정했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포인트다(응답률 16.0%).
한·미 대통령 취임사 비교해보니 …
과거를 “변방의 역사”라고 한 한국 대통령
6·25 장진호 전투까지 거론한 미국 대통령
“역사엔 국정운영의 온갖 비법이 담겨 있다.”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영국 총리의 말이다. 동양에서도 역사는 제왕학(帝王學)의 핵심이었다. 세종은 “경서와 사기 중 보지 않은 게 없다”고 말하곤 했다. 과거는 현재를, 또 미래를 보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공동체의 기억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국민을 한데 묶는 끈이 될 수 있다. 국가 지도자의 역사 인식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80년대 이후 한·미 대통령의 취임사를 비교했다. 한마디로 달라도 너무 달랐다.
◆긍정 vs 부정=2001년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미국 역사를 이 같이 규정했다. “구세계의 우방이자 해방자가 된 새로운 세계의 얘기이고, 노예를 소유했으나 이제는 자유의 공복이 된 사회의 이야기이며, 세계를 소유하는 대신 보호했으며 정복하는 대신 보호하기 위해 세계에 뛰어든 한 강대국의 얘기다.”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은 “희망차고 너그럽고 이상주의적이며 대담하고 품위 있으며 공정하다는 게 미국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기에 맞서 역사의 초석을 이룰 결정을 해왔다”고 했다. 어느 나라 역사든 명암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대통령은 어둠보다는 밝음에 주목했다.
우리는 이와 딴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변방의 역사’로 규정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의 역사도 강요받기도 했다”고 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거나 “정의가 패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돼야 한다”는 말도 했다.
◆계승 vs 단절=우리 대통령들의 이런 인식은 과거와의 단절로 이어졌다. 과거에서 배우기보단 과거를 외면했다. 늘 새 출발이라고 했다. 취임 첫날 자신의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 “선진화 원년”(이명박), “민주적 정권교체가 실현됐고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정부가 마침내 탄생한 역사적인 날”(김대중), “문민민주주의 시대를 열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기다렸다”(김영삼) 등이 그 예다.
미국은 전임 대통령을 기억했고 후임자도 유념했다. 적어도 취임사에선 전직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은 삼갔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은 자신까지 포함, “44명의 미국인이 대통령 선서를 했다”고 기억했다. 그러곤 국민에게 “(우리 선조가 그랬듯) 우리가 역경에 들었을 때 외면하거나 주춤하지 않았다고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 하자”고 호소했다.
◆통합 vs 분열=81년 레이건 대통령은 의사당 서쪽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초대 대통령) 동상과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3대),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16대)의 기념관, 알링턴 국립묘지가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들 대통령을 기린 뒤 제2차 세계대전 중 숨진 한 사병의 글을 인용했다. ‘미국이 이겨야 한다. 나는 헌신할 거다. 전체 싸움의 결말이 나한테 달린 일처럼’이란 내용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오늘날 위기는 (알링턴 묘지에 있는) 그 사병 등 수천 명이 희생했던 그런 유는 아니다. 그러나 우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 능력을 믿어야 한다. 우린 미국인이니까”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이 순간 존재하는 건 지도층 사람들의 기술과 비전 때문만이 아니며, 우리가 선조의 이상과 건국 이념을 굳건히 믿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 대통령들은 지도자와 국민을 구분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김영삼), “국민의 힘에 의해 이뤄진 참된 정부”(김대중)라고 평가했다. ‘한없이 자랑스러운 나라’라며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한 이명박 대통령도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주역으로 선열·장병 등 국민만을 거론했다. 어느 취임사에도 지도자의 자리는 없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지도자와 국민을 대립 개념으로 설정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관련, “잘못은 지도층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하는 걸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 취임사는 그 자체로 ‘역사 교재’다.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 제2차 세계대전과 60년대 인권운동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과 위인을 두루 언급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까지 거론했다. 본지 여론조사에선 불과 국민의 14.6%만 6·25전쟁 중 일어난 사건이란 걸 알 정도로 대한민국조차 제대로 기리지 못하는 전투를 말이다. 반면 우리 대통령 취임사에서 거론된 위인은 백범(白凡) 김구 선생이 유일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꽃을 심는 자유여야 한다”는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했다.
특별취재팀=배영대·고정애·천인성·박수련·심서현 기자, 뉴욕·베이징·도쿄 정경민·장세정·박소영 특파원, 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
특별취재팀=배영대·고정애·천인성·박수련·심서현 기자, 뉴욕·베이징·도쿄 정경민·장세정·박소영 특파원, 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







공유(greatcorea)

 댓글 3개
| 엮인글 0개
댓글 3개
| 엮인글 0개
개벽문화 칼럼
22.
9· 11 과 3· 11
2011.06.02,
조회 2427
개인이든 가정이든 단체든 성장할 때와 쇠퇴할 때가 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음이 자연의 섭리며 역사의 교훈이다. 성장기에는 상승을 예고하는 사건이 있고, 쇠퇴기로 접어들면 장차 쇠퇴함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난다. 국가의 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 뉴욕에 있는 초고층 국제무역센터 빌딩이 비행기 자살테러로 붕괴 되...
21.
흥과 신명나는 놀이의 회복
2011.06.02,
조회 2883
춘3월을 맞이하며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3월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다. 입춘이 지났지만 추위가 매섭거나 봄꽃이 더딜 때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한나라 원제 때 절세미녀 왕소군이 강제로 흉노족에게 시집가서 지은 시에서 나왔다. 낯설은 흉노 땅에서 봄꽃을 대하니 봄날의 정취도 없다는 뜻이다(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그러나 불사춘이라 해도 3월은 만...
20.
문명담론과 인류공동체
2011.05.23,
조회 2455
박제훈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세계화시대 인류는 지구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 수밖에 없다.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민주화물결이 중국과 북한에까지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에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 일본의 방사능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유럽과 미국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에도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커져 한국사회가 다...
19.
비빔 혹은 섞임
2011.05.02,
조회 2434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뒤섞여 구성원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일은 미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단한 사건이다.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는 종교, 사상, 산업, 문화,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비벼 넣기의 징후가 뚜렷하다. 특히 교통, 통신, 정보산업이 속도 경쟁에 빠져 있는 요즈음 전화기와 MP3, 컴퓨터, 게임기, TV 등 다기능을 합쳐놓은 스마트폰의...
18.
대보름 오곡밥은 드셨나요?
2011.02.17,
조회 2822
“오곡밥은 먹어야지?” 지금도 정월대보름이 오면 시골의 노모는 전화를 한다. 며느리를 찾아 오곡밥을 먹는지 꼭 챙긴다. 대도시 서울에 사는 아들네의 살림살이를 몰라서가 아니다. 어제가 곧바로 옛날이 되어버리는, 팽팽 돌아가는 21세기의 세상임을 잘 안다. 하지만 노모에게 정월대보름은 아직까지 그 어느 때보다 귀중한 날이다. 한 해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지내...
17.
[한자로 보는 세상] 疫病
2011.01.31,
조회 3200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 중 ‘천관서(天官書)’를 지어 하늘의 현상을 인간사의 길흉과 관련지어 해석했다. 그는 하늘의 항성(恒星) 28수(宿) 중 동쪽 하늘의 저성(氐星)이 하늘의 끝(天根)으로 역병(疫病)을 주재한다고 보았다. 역병은 유행성 급성 전염병(傳染病)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는 역(疫)을 ‘백성이 모두 병들다(民皆疾也)’라고 풀이했...
>>
한국사 교육, 빙하기에 들다
[3]
2011.01.12,
조회 4126
올해부터 한국사 한 줄 안 배워도 고교 졸업 가능국민 91%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영혼 잃은 교육, 보수의 아이러니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공식 만찬이 열린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 대통령은 “뷰티풀”을 외치며 최광식 박물관장에게 “한국문화가 이렇게 독특한지 몰랐다”고 했다. 한국의 교...


 인쇄
인쇄 스크랩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