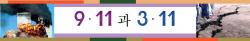대보름 오곡밥은 드셨나요?

“오곡밥은 먹어야지?” 지금도 정월대보름이 오면 시골의 노모는 전화를 한다. 며느리를 찾아 오곡밥을 먹는지 꼭 챙긴다. 대도시 서울에 사는 아들네의 살림살이를 몰라서가 아니다. 어제가 곧바로 옛날이 되어버리는, 팽팽 돌아가는 21세기의 세상임을 잘 안다. 하지만 노모에게 정월대보름은 아직까지 그 어느 때보다 귀중한 날이다. 한 해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지내기 위해 간절한 소망을 담아내는 날이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바뀐다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뿌리는 변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기층문화의 질긴 생명력이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세시풍속 체험의 장이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것이다 보니 생명이 없다. 그야말로 박제화된 체험행사들이다. 세시풍속은 시대나 사람들의 살림살이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게 당연하다. 특히 기층문화는 활짝 꽃을 피우다가 소멸되고, 또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만들어진다.
문제는 우리의 세시풍속, 나아가 민속문화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맥이 끊기고 단절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식민주의자들의 치밀한 전략과 전술 아래 왜곡되고, 해방 이후 미국 중심의 서구문화가 급작스럽게 밀려들면서 폄훼당한 것도 한 이유다.
농경사회를 지나고 산업사회를 거쳐 첨단 정보화사회에 이른 우리가 농경사회의 세시풍속을 오늘에 그대로 되살리고, 계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거죽만 남은 세시풍속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이 담겨 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바뀌지 않고, 또 바뀔 수 없는 삶의 지혜, 자연과 이웃에 대해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신과 태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원래 대보름 오곡밥은 세 집 이상 성이 다른 집의 밥을 먹어야 그 해의 운이 좋다고 한다. 굳이 이웃과 밥을 나누며 새삼스레 정을 돈독히 하고, 지역 공동체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정월대보름만이 아니라 삼짇날, 단오, 유두, 칠월칠석, 백중, 동지 등에도 오곡밥 나눠먹기처럼 공동체를 생각하는 정신이 실려 있다. 또 인간의 오만함을 털어내고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개인적으로 보다 더 충실한 삶을 도모하려는 뜻도 곳곳에 녹아 있다.
공동체성의 회복,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개인 삶의 충실성은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정월대보름을 맞은 오늘 한번쯤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생각했으면 싶다. 그 옛날처럼 드넓은 밤하늘에서 대보름달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승용차·전동차의 창밖으로, 아파트 베란다나 쌈지공원에서 대보름달을 잠깐 바라보자. 그리고 이웃 공동체를, 자연을, 나를 한번 돌아보자.







공유(greatcorea)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댓글 0개
| 엮인글 0개
개벽문화 칼럼
22.
9· 11 과 3· 11
2011.06.02,
조회 2428
개인이든 가정이든 단체든 성장할 때와 쇠퇴할 때가 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음이 자연의 섭리며 역사의 교훈이다. 성장기에는 상승을 예고하는 사건이 있고, 쇠퇴기로 접어들면 장차 쇠퇴함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난다. 국가의 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 뉴욕에 있는 초고층 국제무역센터 빌딩이 비행기 자살테러로 붕괴 되...
21.
흥과 신명나는 놀이의 회복
2011.06.02,
조회 2885
춘3월을 맞이하며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3월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다. 입춘이 지났지만 추위가 매섭거나 봄꽃이 더딜 때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한나라 원제 때 절세미녀 왕소군이 강제로 흉노족에게 시집가서 지은 시에서 나왔다. 낯설은 흉노 땅에서 봄꽃을 대하니 봄날의 정취도 없다는 뜻이다(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그러나 불사춘이라 해도 3월은 만...
20.
문명담론과 인류공동체
2011.05.23,
조회 2456
박제훈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세계화시대 인류는 지구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 수밖에 없다.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민주화물결이 중국과 북한에까지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에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 일본의 방사능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유럽과 미국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에도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커져 한국사회가 다...
19.
비빔 혹은 섞임
2011.05.02,
조회 2434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뒤섞여 구성원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일은 미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단한 사건이다.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는 종교, 사상, 산업, 문화,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비벼 넣기의 징후가 뚜렷하다. 특히 교통, 통신, 정보산업이 속도 경쟁에 빠져 있는 요즈음 전화기와 MP3, 컴퓨터, 게임기, TV 등 다기능을 합쳐놓은 스마트폰의...
>>
대보름 오곡밥은 드셨나요?
2011.02.17,
조회 2823
“오곡밥은 먹어야지?” 지금도 정월대보름이 오면 시골의 노모는 전화를 한다. 며느리를 찾아 오곡밥을 먹는지 꼭 챙긴다. 대도시 서울에 사는 아들네의 살림살이를 몰라서가 아니다. 어제가 곧바로 옛날이 되어버리는, 팽팽 돌아가는 21세기의 세상임을 잘 안다. 하지만 노모에게 정월대보름은 아직까지 그 어느 때보다 귀중한 날이다. 한 해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지내...
17.
[한자로 보는 세상] 疫病
2011.01.31,
조회 3201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 중 ‘천관서(天官書)’를 지어 하늘의 현상을 인간사의 길흉과 관련지어 해석했다. 그는 하늘의 항성(恒星) 28수(宿) 중 동쪽 하늘의 저성(氐星)이 하늘의 끝(天根)으로 역병(疫病)을 주재한다고 보았다. 역병은 유행성 급성 전염병(傳染病)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는 역(疫)을 ‘백성이 모두 병들다(民皆疾也)’라고 풀이했...
16.
한국사 교육, 빙하기에 들다
[3]
2011.01.12,
조회 4127
올해부터 한국사 한 줄 안 배워도 고교 졸업 가능국민 91%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영혼 잃은 교육, 보수의 아이러니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공식 만찬이 열린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 대통령은 “뷰티풀”을 외치며 최광식 박물관장에게 “한국문화가 이렇게 독특한지 몰랐다”고 했다. 한국의 교...


 인쇄
인쇄 스크랩
스크랩